Home >
여행소식
| 제목 | [기자의 눈으로 본 네팔] 폐허의 아픔 딛고 희망을 일구다! _최흥수 기자 |
|---|---|
| 작성자 | 황*지 |
| 작성일 | 2015.09.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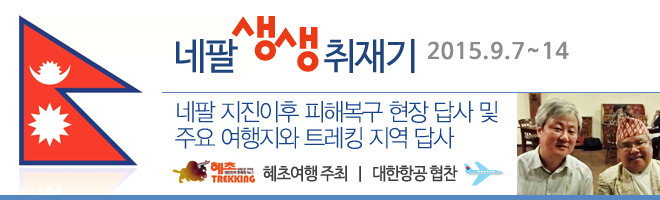 “레쌈 삐리리~~ 레쌈 삐리리~~” 13일 오후 파탄(Patan) 황금사원에 피리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의 아리랑 후렴구쯤 되는, 상황에 맞게 노랫말을 붙이는 네팔의 전통 가락이다. 흥겨운 리듬은 정선아리랑보다는 밀양아리랑에 가깝다. 악기를 연주하는 남성 무리들 뒤로 화려한 복장의 여성들이 제물을 담은 쟁반을 들고 뒤따른다. 족히 100명은 될 듯하다. 그 뒤로 남녀 노인이 올라앉은 두 개의 꽃 가마가 뒤따르며 행진이 시작된다. 관광객과 구경꾼까지 몰려들어 좁은 골목이 미어터질 듯하다. 77세 노인의 생일 축하 퍼레이드다. 행렬은 더르바르 광장을 통과해 다음 골목으로 자취를 감췄다. 광장 중앙 무너진 석탑엔 철망이 둘러져 있다. 잔해는 바로 옆 왕궁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 중이다. 오스트리아 한 대학의 보존복원연구팀이 두 동강난 석상을 맞추고 있다. 작업장 뒤로는 언제 복원할 지 알 수 없는 정교한 나무조각 기둥이 널브러져 있다. 지난 4월 대지진으로 8,800명(9월초 정부집계)이 숨지는 대참사 속에서도 의연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네팔의 현재 모습이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신이 버린 땅이라고 여길 만큼 폐허가 됐을 것 같지만 피해가 집중된 오래된 유적을 제외하면 수도 카트만두의 겉모습은 평시와 다름없다. 사전 정보가 없다면 붕괴된 유물 조차도 원래 모습으로 착각할 정도다.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으로 통하는 타멜 시장은 짐꾼과 수레 오토바이 차량이 뒤엉켜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붐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를 받혀 놓은 왕궁 주변은 상인과 행인들로 넘치고, 유적 곳곳엔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한쪽으로 치워놓은 건물 잔해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둘기떼가 제물을 받아먹기 위해 몰려 있다. 카트만두 밸리(고대 왕궁이 있는 카트만두, 박타푸르, 파탄 3개 지역을 합쳐 밸리로 부른다)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박타푸르(전체 건물의 약 30%, 사망자 333명)도 활력으로 넘친다. 시장만큼 생생한 삶의 현장은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최소 400~500년 된 건물들은 일상과 유리된 관광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유지돼 왔다. 문화유적 자체가 상업공간이자 주거공간이고 기도시설이다. 그래서 참사의 흔적과 삶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넘치는 인파와 정신 없이 울리는 경적소리는 불과 5개월 전의 비극 조차 삼켜버린 지 오래인 듯하다.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는 보호막을 치고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는 게 상식이지만 이곳은 네팔이다. 무너진 건물과 잔해도 관광 대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 정부에게 체계적인 절차에 따른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100여 개에 달하는 정당은 지진피해복구보다는 새 헌법제정 문제로 몇 년째 각 종족과 분파의 이익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네팔은 2008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 국가가 됐다). 박타푸르 유적지구가 끝나는 곳에는 아직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 캠프가 자리잡고 있었다. 철조망에 내걸린 ‘Heart to God, Hand to Man’이라는 구호단체의 문구가 시선을 잡는다. 참혹한 현실과 운명은 신의 뜻일 수 밖에 없지만, 힘이 되는 건 결국 인간이 내미는 따스한 손길이다. “대지진 이후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네팔을 사랑한다면 많이 오시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다는 가이드 빠담(Padam)의 작별 인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심정도 이랬을 듯하다. 카트만두=최흥수기자 ☞ 기사 크게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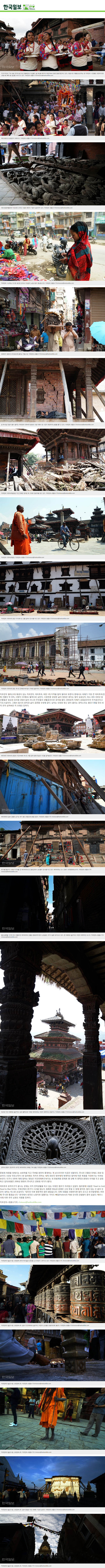 |
|



 전체 메뉴
전체 메뉴 목록
목록